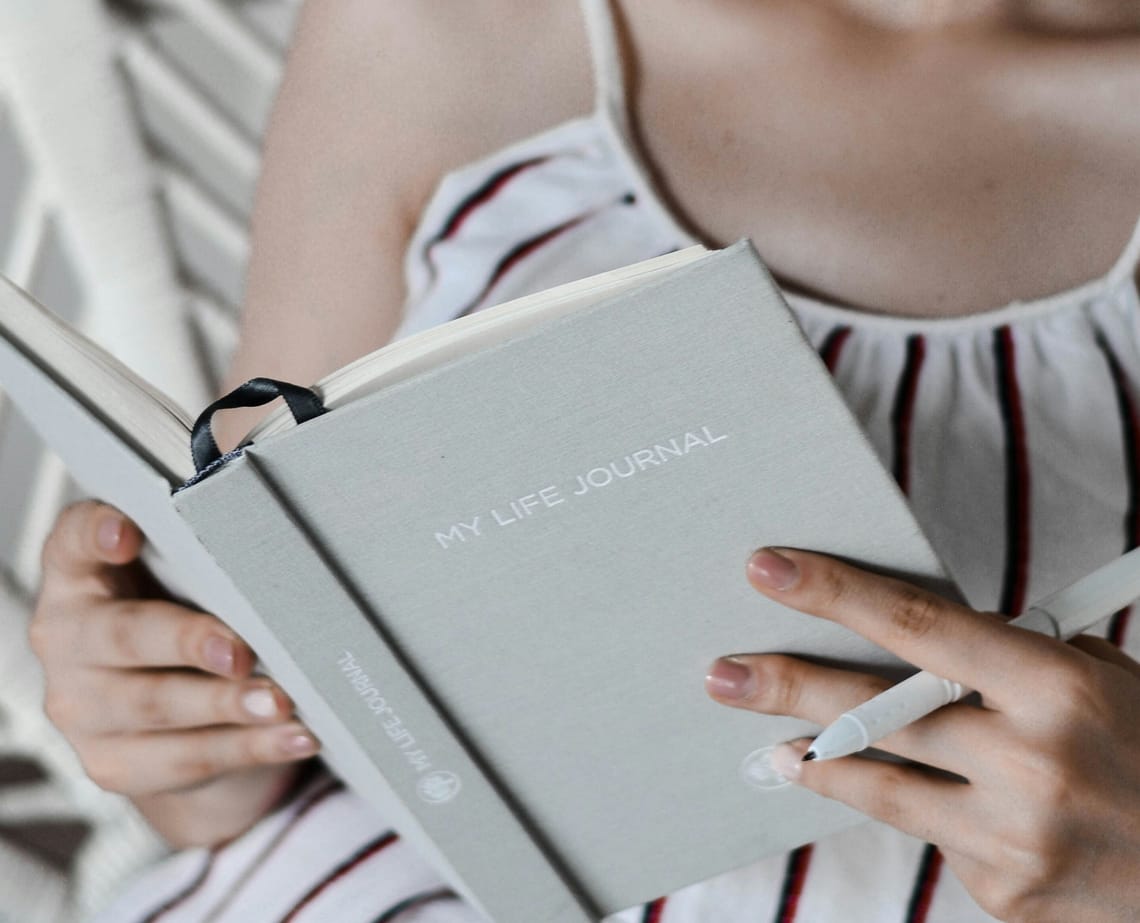요즘 웬만하면 검색을 잘 하지 않는다.
무언가 궁금한 게 생기면 일단 GPT에게 먼저 물어본다.
정확한 맥락을 설명하지 못해도 괜찮다.
그냥 에러 로그 하나만 던져줘도 GPT는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해준다.
어떤 기능을 어떻게 구현해야 할지 막막할 때도
"이럴 땐 어떻게 처리해?"라고 물어보는 것만으로
이전엔 몇 단계의 검색과 클릭이 필요했던 정보들을 순식간에 얻는다.
심지어 공식 문서보다 더 명확하게, 더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경우도 많다.
구글 검색처럼 광고를 피해서 클릭할 필요도 없다.
'찾는 시간'을 줄이는 데 있어 GPT는 그 자체로 훌륭한 최적화 도구다.
그런 도구에 익숙해질수록 문득 이런 생각이 스친다.
'나는 왜 여전히 기록을 하고 있을까?'
'이건 그냥 시간 낭비 아닌가?'
기록의 의미에 대해 스스로 답을 찾고 싶어져서 고민하고 정리해봤다.
경험이 나만의 것이 아닌 시대
예전에는 "이거 해봤습니다"라는 한마디에 무게감이 있었다.
경험 그 자체가 중요한 가치였고
누군가가 그것을 직접 해봤다는 사실이
신뢰의 근거이자 노하우의 상징이 되곤 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달라졌다.
내가 겪는 대부분의 상황은 이미 수많은 사람이 겪은 일이고 대다수 문제는 어딘가에서 해결된 적이 있다.
그리고 대규모 언어 모델 LLM은 그 수많은 시행착오와 해결 과정을
데이터로 학습해두고 있다.
GPT는 나보다 더 많은 문제를 경험했고
그 중에서 가장 '가능성 높은 해답'을 빠르게 요약해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단순히 '겪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의미를 갖기 어려워진다.
경험은 더 이상 희소하지 않고 지식은 넘쳐나며
무언가 해봤다는 것도 이젠 특별함을 담보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나는 왜 여전히 기록을 남기고 있을까. 지금 이 행위는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그럼에도 나는 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나는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다.
에러가 해결된 순간, 구조를 바꿨던 결정의 지점,
처음에는 전혀 감이 오지 않던 흐름이 어느 순간 눈에 들어오던 순간들.
이런 장면들을 나는 기록한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라기보다 미래의 나 자신을 위해서다.
오히려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판단했는가를 기억하는 일이다.
그 흐름을 구조화해서 남겨두는 작업이다.
기록은 하나의 복기 도구다.
생각의 흐름을 되짚는 훈련이자 그 사고 구조를 미래에 재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힌트가 된다.
정답보다 중요한 것
경험은 더 이상 희소하지 않다. 그래서 중요한 건 '겪었는가'가 아니라 '그걸 어떻게 풀었는가'에 있는듯하다.
내가 어떤 시행착오를 겪었고 무엇을 놓쳤다가 발견했는지. 그 과정에서 뭘 배웠고 왜 지금 이 구성을 선택했는지 그건 나만 안다. 그런 흐름은 살아 있는 것이 된다.
기록은 시간을 들여 사고의 흐름을 정리하는 일이다.
정답을 외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 정답에 도달했는지를 남기는 일이다.
언젠가 비슷한 흐름 속에 다시 들어갔을 때 그 기록이 나를 구해줄지도 모른다.